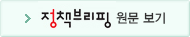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플럭스 데이터 기반 탄소지도 제작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AI를 활용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 예측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주요 산림에 설치된 플럭스타워 관측자료, 위성 영상, 생태계 모델링 등을 결합한 기계학습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정량화한 '산림 탄소지도'를 전국 단위로 제작했다. 최근에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탄소흡수량 예측 기법을 일본 치바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 플럭스타워 : 산림과 대기 간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산림생태계의 생산성과 건강성을 평가하는 핵심 장치.
이번 연구는 20여년간 축적된 산림 탄소 플럭스 정보(1초당 10회 연속 관측)와 위성 영상,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등 빅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해 탄소흡수량을 정밀하게 산정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남 및 경남 등 남부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 산림에서 탄소흡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특히 봄철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영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산림 플럭스타워가 미설치되어 관측자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정확도에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플럭스타워 추가 설치와 AI 알고리즘 고도화 연구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김아름 연구사는 "정량화된 산림 탄소흡수량 데이터는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 산림 협력 정책에 필수 자료"라며, "앞으로도 실측 기반 빅데이터를 확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산림 탄소예측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